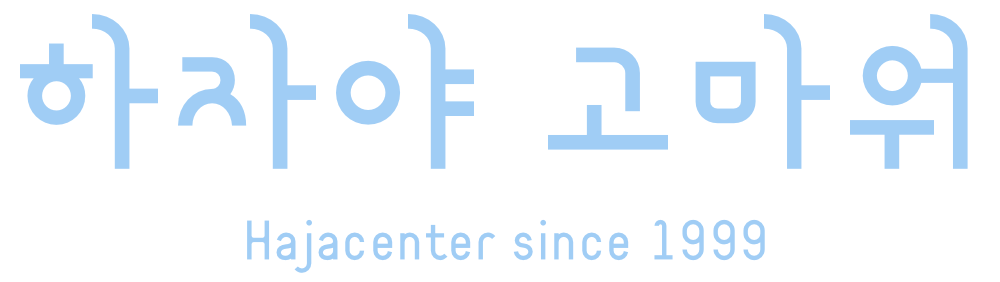그런 날이 있다.
주위가 희뿌여지며 휘청이게 되는 날
한없이 꺼지는 바닥으로 주저앉고 싶은 날
어느새 난 그곳에 서 있다.
해와 달과 바람과 별과 나무와 새
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친구와 이웃과 삶의 이름으로
부르고 불리며
시를 짓고 그리고 노래하며 떠들썩한 마을
무심한 눈길이 지나치는 사람들의
구석이나 어귀에 웅크려 앉았어도
내 자리인 듯 존중받는 그곳
그거봤어 비밀인데 걔말인데 어제말야
그래서
꼬리를 무는 소문이 소동이 되고 소란이 되어도
어른과 젊은이와 아이들이 둘러앉으면
금새 마을의 합창으로 남게 되는 곳
그래서
센척 약한척 섬세한척 쿨한척 뭐든 척척 하는 척
타고난 척을 아닌 척 없는 척 하지 않을 수 있어
친구가 되는 곳
파랑과 빨강으로 남녀가 구분되는 건 당연하지 않고
어린이든 어른이든 함부로 마주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
열심히 착하게 예의바르게 사는 건 당연하지 않고
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,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건 당연한
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고 하고
지금껏 당연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당연해야 한다고 하는
그래서 새벽 드는 낯선 찬 바람처럼
번쩍 깨어나던 시간들
산다는 건 익숙한 걸 견디는 거 같아요.
그렇게 견디며 고요, 풍요, 익숙한 담요 안에서
내다보지 않아도 아는 듯 익숙해질 때,
가라앉고 싶어질 때, 견디는 게 지겨워질 때
그런 날에는 잠시 바닥에 쪼그려 앉아
언젠가 그곳으로
그곳에 있던 내게로 부는 바람을 느껴본다.
그리고 쓸데없이 불룩한 주머니를 비워
그 바람을 담는다
맘껏 가난하며 신났던
함께 했던 그날들로 채운다.
하자야 고마워 그렇게 그곳에 있어 내가 산다.
하자야 축하해 이렇게 이곳에 내가 있어 산다.